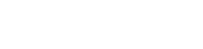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그만 쓰자 끝.”
32년 만에 증보하여 펴내는
시인 최승자의 첫 산문!
비어서 빛나는 자리,
최승자의 40여 년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는 ‘오랜 묵힘’을 지난 최승자 시인의 기별이다. 출간 소식으로는 2016년 시집 『빈 배처럼 텅 비어』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시집과 전작 『물 위에 씌어진』 사이에도 5년의 침묵이 있었다.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시집의 간격은 11년으로 더 길었다. 좀처럼 자주 기별하지 않는 시인. “내가 살아 있다는 것,/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일찍이 나는」) 말했던 시인.
4부로 추가된 근작 중에는 아예 「최근의 한 10여 년」이라 머리를 달았다. 어떠한 욕심도 없으므로 꾸밈은 더 없는 근황이다. 1998년 시집 『연인들』을 펴내던 중 발병한 조현병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서양 점성술과 신비 체계, 지나서는 노자와 장자 사이 “어떤 비밀스러운 다리를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그러나 해체는커녕 구조를 보는 것조차 허락해주지 않는 그 다리 위에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고, 시인은 무심히 말한다. 나를 병에 지치게 한 것들에서 이제 그만 손을 떼야겠다고, 다만 ‘letting go’ 해버렸다고.
그리하여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물으면 시인의 대답은 그저 무심하다. “문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 그러므로 “시는 그대로 쓸 것”이라고. 이미 예전의 자신과는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그 돌아올 곳이 문학임에는 의심이 없다. “어떤 시원성(始原性)에 젖줄을 대고 있는 푸근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이상하고 슬픈 설화 형식의 아주 짧은 소설들을 써보고 싶다”는 비전을 슬며시 내비치기도 했다. 다시금 문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다짐으로, “그래서 요즈음은 문학책들도 부지런히 읽고 있다”고, 무심하여 의심 없는 맑은 언어로(「신비주의적 꿈들」).
그렇게 ‘최근의 한 10여 년’을 돌아본 때로부터 다시 10여 년이 흘렀다. 그사이 2014년에 출판사가 시인에게 이 산문집의 재출간을 요청했고 2019년 허락을 받았다. 2021년 11월 11일, 재출간을 앞두고 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시인에게 새 ‘시인의 말’을 받아적었다. 수화기 너머 또박또박, 섞박지용 순무 써는 듯한 큼지막한 발음이었다.
오래 묵혀두었던 산문집을 출판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자니
웃음이 쿡 난다.
웃을 일인가.
그만 쓰자
끝.
―「개정판 시인의 말」 전문
잡균 섞인 절망보다는
언제나 순도 높은 희망을
이 책을 말할 때, 아니 최승자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죽음’일 것이다. 시인이 문득 과거를 돌아볼 때 죽음은 태연히 거기에 있다. 아예 책 속에 「죽음에 대하여」라는 글도 있다. 외할머니댁 머슴 일중이 아저씨의 ‘스스로 나선’ 죽음, 첫 하숙집 주인아저씨의 ‘농담 같은’ 죽음, 슬픔 가운데 ‘위안이 된’ 할머니의 죽음.
그러나 그리하여, 최승자는 죽음을 넘어, 죽음의 다음으로, ‘죽음의 죽음’에까지 나아간다. 그저 덤덤히 “죽음은 깊고 짙고 강렬하며 무르익은 관능과 연결된 것”이었다 고백하며, 그것이 “내가 나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 곧이 반성하는 것이다.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관능이라 믿었던 ‘죽음’의 실체마저 죽임을 당할 때, 시인은 자신의 네번째 시집 『내 무덤, 푸르고』의 제목을 다르게 읽어본다. “하긴, 그것은 내 죽음을 담은 무덤이었는지도 모르겠다.”(「H에게」)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언제나 확실한 절망을 택했다”던 시인. 그러나 최승자는 끝내 절망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대신 번번이 삶으로 돌아나온다. 홀연히 삶이라는 루머 속으로 되돌아온다. “어차피 한판 놀러 나왔으니까, 신명 풀리는 대로 놀 수밖에” 없다고(「산다는 이 일」) 선언하며, 한판 인생 재미있게 풀려주지 않을 바에야 먼저 “깽판” 쳐버리겠다고, 절대로 고이 죽어주지 않겠노라고(「시를 뭐하러 쓰냐고?」) 다짐하며.
시인은 죽음 쪽으로 꺾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여 너머를 본다. 거기서 성큼 더 나아가 우주와 신비, 정신의 세계로 훌쩍 떠나버린 듯도 보인다. “세계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근원적으로 이해하려는”(황현산) 시도라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절망하게 하더라도, 시인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오직 그것’이란 결국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곳, 다시 삶의 자리다. “눈 가린 절망과 눈 가린 희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습성”으로, 삶과 맞서면서도 삶을 아주 벗지는 않고, ‘떠나면서 되돌아오면서’ 단단해지는 삶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인간은 강하되, 그러나 그 삶을 아주 떠나지는 못하고, 아주 떠나지는 못한 채, 그러나 수시로 떠나 수시로 되돌아오는 것일진대,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한번 물으면 어느새 비가 내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두 번 물으면 어느새 눈이 내리고, 그사이로 빠르게 혹은 느릿느릿 캘린더가 한 장씩 넘어가버리고, 그 지나간 괴로움의 혹은 무기력의 세월 위에 작은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보면, 사랑인가, 작은 회한들인가, 벌써 잎 다 떨어진 헐벗은 나뭇가지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한 해가 이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헐벗음 속에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살아 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시인이 말했듯 결국,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발음해야만 한다’.
―「떠나면서 되돌아오면서」 중에서
나는 지금 그 순간을 꿈꾸고 있다.
내가 첫발을 떼어놓는 그 순간을.
시원에의 그리움으로 “시원병(始源病)”을 앓고 있다는 시인(『물 위에 씌어진』 시인의 말).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성으로서 출생신고를 한, 우리 시대의 첫번째 시인”(김소연). 그는 시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고, 문 뒤의 문을, 문 너머의 문을 거듭 열어젖히며 나아왔다. 살아짐으로 살아남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을 이름이 되었다. 그 이름대로, “최승자가 어디에 있건 그는 이기는 자이다. 그는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다”(황현산).
25세에 자신이 썼던 “다시 나는 젊음이라는 열차를 타려 한다”라는 문장을 마주하고 웃음이 나올 뿐이라던 38세의 시인. 다시 32년 만에 돌아보게 된 자신의 말을 앞에 두고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자니 웃음이 쿡 난다”는 70세의 시인. “웃을 일인가” 스스로 물으며 “그만 쓰자” 스스로 답하는 시인. “끝”,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두는, 한 게으른 시인. 최승자라는, 부단히도 게으른 한 시인의 이야기.
시에 대한 신앙도 믿음도 열정도 없고, 시를 쓰고 나면 다시 읽어보기도 싫고, 시를 쓰고 나서도 마뜩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뭔가 미진하고 뭔가 아쉬워서 뭉기적뭉기적 시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시인, 메마른 불모의 시인. (……)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 단 한 가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 보자면 나는 낭만주의자이다. 그러나 그 단 한 가지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임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지 않는 것들 속으로 천연덕스럽게, 어기적거리며 되돌아온다.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중에서
32년 만에 증보하여 펴내는
시인 최승자의 첫 산문!
비어서 빛나는 자리,
최승자의 40여 년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는 ‘오랜 묵힘’을 지난 최승자 시인의 기별이다. 출간 소식으로는 2016년 시집 『빈 배처럼 텅 비어』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시집과 전작 『물 위에 씌어진』 사이에도 5년의 침묵이 있었다.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시집의 간격은 11년으로 더 길었다. 좀처럼 자주 기별하지 않는 시인. “내가 살아 있다는 것,/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일찍이 나는」) 말했던 시인.
4부로 추가된 근작 중에는 아예 「최근의 한 10여 년」이라 머리를 달았다. 어떠한 욕심도 없으므로 꾸밈은 더 없는 근황이다. 1998년 시집 『연인들』을 펴내던 중 발병한 조현병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서양 점성술과 신비 체계, 지나서는 노자와 장자 사이 “어떤 비밀스러운 다리를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그러나 해체는커녕 구조를 보는 것조차 허락해주지 않는 그 다리 위에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고, 시인은 무심히 말한다. 나를 병에 지치게 한 것들에서 이제 그만 손을 떼야겠다고, 다만 ‘letting go’ 해버렸다고.
그리하여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물으면 시인의 대답은 그저 무심하다. “문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 그러므로 “시는 그대로 쓸 것”이라고. 이미 예전의 자신과는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그 돌아올 곳이 문학임에는 의심이 없다. “어떤 시원성(始原性)에 젖줄을 대고 있는 푸근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이상하고 슬픈 설화 형식의 아주 짧은 소설들을 써보고 싶다”는 비전을 슬며시 내비치기도 했다. 다시금 문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다짐으로, “그래서 요즈음은 문학책들도 부지런히 읽고 있다”고, 무심하여 의심 없는 맑은 언어로(「신비주의적 꿈들」).
그렇게 ‘최근의 한 10여 년’을 돌아본 때로부터 다시 10여 년이 흘렀다. 그사이 2014년에 출판사가 시인에게 이 산문집의 재출간을 요청했고 2019년 허락을 받았다. 2021년 11월 11일, 재출간을 앞두고 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시인에게 새 ‘시인의 말’을 받아적었다. 수화기 너머 또박또박, 섞박지용 순무 써는 듯한 큼지막한 발음이었다.
오래 묵혀두었던 산문집을 출판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자니
웃음이 쿡 난다.
웃을 일인가.
그만 쓰자
끝.
―「개정판 시인의 말」 전문
잡균 섞인 절망보다는
언제나 순도 높은 희망을
이 책을 말할 때, 아니 최승자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죽음’일 것이다. 시인이 문득 과거를 돌아볼 때 죽음은 태연히 거기에 있다. 아예 책 속에 「죽음에 대하여」라는 글도 있다. 외할머니댁 머슴 일중이 아저씨의 ‘스스로 나선’ 죽음, 첫 하숙집 주인아저씨의 ‘농담 같은’ 죽음, 슬픔 가운데 ‘위안이 된’ 할머니의 죽음.
그러나 그리하여, 최승자는 죽음을 넘어, 죽음의 다음으로, ‘죽음의 죽음’에까지 나아간다. 그저 덤덤히 “죽음은 깊고 짙고 강렬하며 무르익은 관능과 연결된 것”이었다 고백하며, 그것이 “내가 나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 곧이 반성하는 것이다.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관능이라 믿었던 ‘죽음’의 실체마저 죽임을 당할 때, 시인은 자신의 네번째 시집 『내 무덤, 푸르고』의 제목을 다르게 읽어본다. “하긴, 그것은 내 죽음을 담은 무덤이었는지도 모르겠다.”(「H에게」)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언제나 확실한 절망을 택했다”던 시인. 그러나 최승자는 끝내 절망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대신 번번이 삶으로 돌아나온다. 홀연히 삶이라는 루머 속으로 되돌아온다. “어차피 한판 놀러 나왔으니까, 신명 풀리는 대로 놀 수밖에” 없다고(「산다는 이 일」) 선언하며, 한판 인생 재미있게 풀려주지 않을 바에야 먼저 “깽판” 쳐버리겠다고, 절대로 고이 죽어주지 않겠노라고(「시를 뭐하러 쓰냐고?」) 다짐하며.
시인은 죽음 쪽으로 꺾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여 너머를 본다. 거기서 성큼 더 나아가 우주와 신비, 정신의 세계로 훌쩍 떠나버린 듯도 보인다. “세계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근원적으로 이해하려는”(황현산) 시도라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절망하게 하더라도, 시인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오직 그것’이란 결국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곳, 다시 삶의 자리다. “눈 가린 절망과 눈 가린 희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습성”으로, 삶과 맞서면서도 삶을 아주 벗지는 않고, ‘떠나면서 되돌아오면서’ 단단해지는 삶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인간은 강하되, 그러나 그 삶을 아주 떠나지는 못하고, 아주 떠나지는 못한 채, 그러나 수시로 떠나 수시로 되돌아오는 것일진대,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한번 물으면 어느새 비가 내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두 번 물으면 어느새 눈이 내리고, 그사이로 빠르게 혹은 느릿느릿 캘린더가 한 장씩 넘어가버리고, 그 지나간 괴로움의 혹은 무기력의 세월 위에 작은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보면, 사랑인가, 작은 회한들인가, 벌써 잎 다 떨어진 헐벗은 나뭇가지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한 해가 이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헐벗음 속에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살아 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시인이 말했듯 결국,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발음해야만 한다’.
―「떠나면서 되돌아오면서」 중에서
나는 지금 그 순간을 꿈꾸고 있다.
내가 첫발을 떼어놓는 그 순간을.
시원에의 그리움으로 “시원병(始源病)”을 앓고 있다는 시인(『물 위에 씌어진』 시인의 말).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성으로서 출생신고를 한, 우리 시대의 첫번째 시인”(김소연). 그는 시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고, 문 뒤의 문을, 문 너머의 문을 거듭 열어젖히며 나아왔다. 살아짐으로 살아남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을 이름이 되었다. 그 이름대로, “최승자가 어디에 있건 그는 이기는 자이다. 그는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다”(황현산).
25세에 자신이 썼던 “다시 나는 젊음이라는 열차를 타려 한다”라는 문장을 마주하고 웃음이 나올 뿐이라던 38세의 시인. 다시 32년 만에 돌아보게 된 자신의 말을 앞에 두고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자니 웃음이 쿡 난다”는 70세의 시인. “웃을 일인가” 스스로 물으며 “그만 쓰자” 스스로 답하는 시인. “끝”,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두는, 한 게으른 시인. 최승자라는, 부단히도 게으른 한 시인의 이야기.
시에 대한 신앙도 믿음도 열정도 없고, 시를 쓰고 나면 다시 읽어보기도 싫고, 시를 쓰고 나서도 마뜩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뭔가 미진하고 뭔가 아쉬워서 뭉기적뭉기적 시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시인, 메마른 불모의 시인. (……)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 단 한 가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 보자면 나는 낭만주의자이다. 그러나 그 단 한 가지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임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지 않는 것들 속으로 천연덕스럽게, 어기적거리며 되돌아온다.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중에서